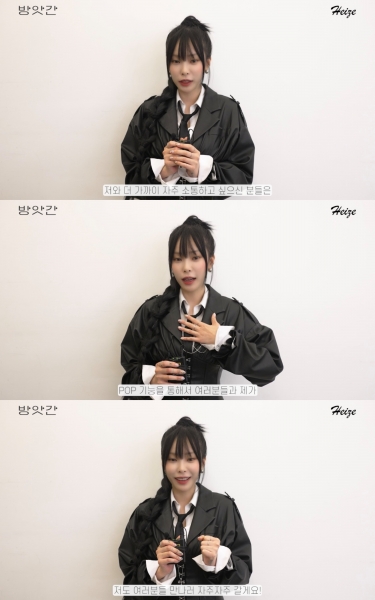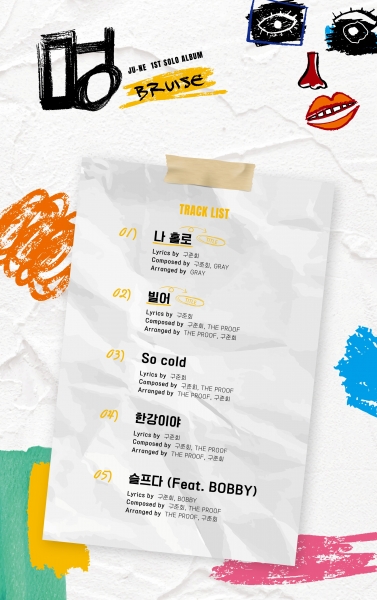-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최근 김을 비롯한 수산물의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산물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에 활용될 과학적 데이터 분석 모델개발을 마치고 현장 활용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6개월간의 개발 기간과 이후 3개월간의 시범 활용 기간을 거친‘수산종자 수급 예측 모델’을 수산 정책 현장에 본격 활용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수산자원공단 간 협업을 통해 진행한 이번 예측 모델 개발은 국내 대표 어종으로 꼽히는 넙치, 김, 전복 3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023년 기준 넙치의 생산 금액은 6,460억원으로 수산물 중 가장 크고 김은 6,3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복은 5,400억원 수준이다.
생산 금액과 소비량이 많은 이들 품목의 가격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종자 단계에서부터 체계적 수급 관리의 필요성이 컸지만, 그간 다른 유통단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모델개발 과정에서는 분석 대상 3종과 관련된 수산종자 및 수산 양식물 수급현황 데이터, 치어 방류실적 데이터, 기후 통계 데이터 등 10종의 공공데이터가 활용됐다.
분석 모델링 도구로는 주기적 특성과 이벤트, 계절성을 고려한 예측에 주로 활용되는 페이스북 프로펫 모델이 사용됐다.
2021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수산종자 생산업 실태 조사’ 데이터와 과거 종자 데이터 등에 대한 분석·학습을 통해 미래의 종자판매 단가, 생산량과 수요량을 예측하는 개념이다.
성능 검증은 분석모델을 통해 예측된 값과 전수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진 과거 실태조사 값 간 비교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분석모델이 예측한 예측값 범위 안에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 값이 포함됨으로써 현장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 개발된 이번 모델은 5월까지 진행된 시범활용 과정에서 국가통계로 매년 시행 중인 ‘수산종자 생산업 실태조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우선 활용됐다.
조사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모델을 통해 확인된 예측치와 실태 조사 값 간 차이가 큰 경우, 심층 조사를 통해 통계의 정확도를 높였다.
그 결과, ‘수산종자 생산업 실태조사’는 통계치 공표 2년만에 통계청 주관 국가통계 품질진단에서 93.9점을 받아 최고 수준인 ‘우수 등급’을 얻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한편 수산 종자별 수급상황 예측 결과를 관계 당국이 과학적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시작한 가운데, 앞으로는 예측 서비스 이용 범위도 점차 넓어질 전망이다.
모델개발 과정에서는 넙치, 김, 전복의 데이터가 활용됐지만, 다른 어류, 해조류, 조개류 등의 수산종자 수급상황 예측에도 활용이 가능한 만큼, 수산업계 전반에 걸쳐 유용한 종자 수급 관리 도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판매가격과 수급 상황 등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종자 단계부터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져 수산물의 가격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향후 구축 예정인 ‘수산종자 통합관리시스템’에도 이 모델을 탑재해 종자생산 및 유통 관련 기관과 수산종자업 관계자, 어민 등에게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수산종자 수급 예측 모델 활용을 통해 수산물의 보다 안정적인 수급과 물가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대상으로 과학적 데이터 분석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